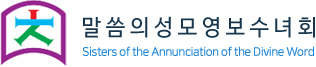연중 제1주간 토요일
본문
연중 제1주간 토 -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관에 앉아 있는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었다."
'앉아 있음'은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저앉은 삶의 상징으로 들린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성경 원문에 따르면 "부활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주저앉은 현실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함으로써 부활한다는 말씀 아닐까?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앉아있던 죄인을 부활시키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바리사이들이 항의한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분을 보면 두꺼운 인습의 껍질 속으로 숨어든다.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 않는 모습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며 주저 않는 이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오늘 다시 이르신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
누군가 세상을 바꾸고 옛 지배 방식을 고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해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를 제외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자신을 제외한 것이다.
우습게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지만 정작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의 모든 악이 존재한다. ....
삶은 단지 대세에 맞춰 살아가기 위한 고군분투의 연속이 아니다.
삶은 일련의 배움의 과정이다.
중세 교회의 신비가 노리치의 율리아나 복녀는 죄에 관한 환시를 보고 “죄도 쓸모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죄는 인간 발전의 도구로써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율리아나 복녀는 "하느님은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 죄가 죄를 벌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왜 죄에 얽매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진 채로 신앙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가 영성의 기반일 때 죄는 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죄는 세상의 끝이 아니다.
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힘든 수많은 일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인색함을 멀리하다 보면 가난함의 자유를 알게 된다.
음욕과 싸우다 보면 결국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강한 분노에 현명하게 대처하다 보면 온유함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에서 연민, 이해, 겸손, 사랑 등을 배운다.
우리가 죄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자질을 얻기 어렵다.
죄는 나약해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안의 죄를 마주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죄는 범죄자들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게 하며, 그들의 분노와 살기를 안아주도록 한다.
결국 죄는 우리가 겸손하고 스스로를 자각하게 한다.
이것은 죄의 가장 좋은 결과다.
겸손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인간의 세속적인 실상을 확실히 깨닫게 하며,
아울러 인간에게 높고 낮음이 없음을 일깨운다.
또한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권한이 없으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매우 경건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랍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돈을 좋지 않은 곳에 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랍비는 말했다.
"내가 이 돈을 줄 때, 하느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을 때보다 더 까다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전염병을 보듯이 피해야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결백을 주장하는 뻔뻔스러움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다. - 조앤 치티스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출처] 말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