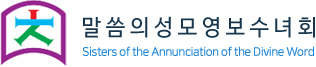연중 제24주일 다해
본문
연중 제24주일 다해 -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말씀은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 찬 말씀들이다. 첫 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느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을 하자 하느님이 진노하시어 재앙을 예고하신다. 이에 모세가 "약속에 충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자 하느님이 재앙을 거두셨다는 이야기다.
하느님의 자비는 복음의 말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천민을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상황이다. 자신들을 하느님을 섬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보고 반발하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참 모습을 비유로 일러주신다. 양 백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놓아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은전 열 닢 중 한 닢을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뒤져 그 한 닢을 찾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말씀이다.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으로 마무리된다. 하느님이 죄인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용서해 주시는 까닭은 죄인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에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라는 말씀이다.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느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선포한다.
대부분의 종교나 윤리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혹은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인간 사회는 이러한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원칙을 바탕으로 질서를 만들었다. 교육기관은 성적과 품행이 좋은 학생에게 상을 주고 나쁜 학생은 벌을 주거나 포기한다. 운동 시합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입상하지 못한 선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법정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 사회에서 격리시킨다. 그런 질서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할 때도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상상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처벌도 철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하느님은 죄인을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신앙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느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세기 교회의 뛰어난 스승이었던 영국의 흄 추기경은 하느님을 오해하는 풍토를 이런 비유로 꼬집었다: 엄마가 외출하며 아이에게 엄하게 일렀다. "저 부엌에 있는 사탕을 절대로 하나도 먹지 말라. 만일 훔쳐먹으면 엄마는 못 보더라도 하느님이 내려다보시고 벌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였다. 하느님은 하늘에서 우리 잘못을 살피시다가 혼을 내시는 분이라는 신앙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오해라며, 흄 추기경은 "진짜 하느님은 아이가 부엌에 몰래 들어가 사탕을 먹으면 지켜보시다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탕을 하나 더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스럽기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진정한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스 큉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선포하신 분"이라고 한다. 이 점이 예수님과 타 종교의 창시자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 몰은 신관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세리나 죄인, 창녀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죄가 많아 그 벌로 병을 앓는다고 손가락질 받던 이들과, 몸이라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느라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던 창녀들, 먹고살기 위해 매국노 짓을 하며 인간 한계의 절망을 살아가던 세리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천지가 개벽할 기쁜 소식이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보게 된다. 신앙은 윤리 도덕과 다르다. 그리스도교는 그저 착하게 살라는 윤리도덕 차원을 넘어서는 종교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교의 바탕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가 배제된 종교, 죄 없고 착하고 잘난 사람들만으로 꾸며진 교회, 문제없는 건강한 이들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고민과 아픔이 없는 신앙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고통 없고 죄 없는 선민들의 공동체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 죄악과 한계상황의 인간을 찾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다시 가슴에 새긴다. 하느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시다. 길 잃은 듯 앞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부끄러워 누구 앞에도 나설 수 없을 때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자. 하느님은 우리 죄인을 찾으면 책망하시기 전에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기쁨은 우리들의 위대하고 거창한 업적에 있지 않다. 보잘것없는 은전 한 닢이 여인에게 큰 기쁨이듯,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느님께 소중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하느님의 큰 기쁨이다.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대가 바로 하느님께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요, 하느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자.
그 사실이 세상살이에 시달리느라 죄만 짓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뒤바꿔 놓는 새로움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는 이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이요, 어떤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근거다. 그래서 화답송의 노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출처] 말씀에